‘소리 없는 소리’로
청중을 명상으로 이끌다

미국 뉴욕주 우드스탁 시에 농가 헛간을 개조하여 만든 콘서트홀이 하나 있었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강한 개성을 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매버릭(Maverick)’이라는 이름의 이 콘서트홀에 1952년 8월, 한 남자가 등장했다. 청중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앞에 놓인 악보를 한동안 살피던 남자는 이윽고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저 33초, 2분 40초 그리고 1분 20초를 지날 때마다 음표 하나 없는 깨끗한 악보만 넘길 뿐이었다. 그렇게 4분 33초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고, 남자는 돌연 일어서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무대를 내려가 버렸다. 관중은 경악했다. 연주자가 해야 할 일, 연주회에 간 청중이 기대하는 경험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이 연주회는 이후 음악뿐 아니라 미학 전반과 연주 분야에서도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952년 이 곡의 초연 무대에 섰던 피아니스트는 데이비드 튜더(David Tudor)였고, 곡의 초연 시간을 따라 ‘4분 33초’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전무후무한 곡의 작곡자는 모더니즘과 전위예술을 대표하는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였다. 발명가의 아들로서 파격적으로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케이지가 작곡한 3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각 악장의 악보에는 음표나 쉼표가 없으며, 음악의 길이에 대한 지시도 없이 오직 ‘TACET(조용히)’라는 악상 기호만 있을 뿐이다. 초연에서는 무작위로 시간을 정하여 1악장을 33초, 2악장을 2분 40초, 3악장을 1분 20초씩 연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4분 33초’가 단지 침묵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케이지 본인의 말을 빌려 ‘의도된 소리의 부재’로 이루어진 이 곡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는 곡이다. 초연 시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웅성거리는 주변의 소리 등으로 구성되었고, 연주회장의 위치나 관객 구성에 따라 분위기가 매번 바뀌는 곡이다.
음악뿐 아니라 회화에도 이렇게 작가의 의도가 배제된 그림, 자연이 만들어 내는 회화 개념을 추구한 사람이 있었다. 케이지의 친구이기도 한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는 이 무렵 ‘화이트 페인팅(White Paintings)’ 시리즈를 제작했는데, 거대한 캔버스에 모노 톤의 흰색을 채웠고, 단지 작품을 구성하는 패널의 개수만 하나에서 다수로 변화가 있을 뿐이었다. 화면 위를 우연히 지나가는 먼지 입자나 빛의 반사, 작품을 보는 관객의 시선과 그림자, 작품을 비추는 조명과 어디선가 들어올 햇살 등을 통해 시시각각 다른 작품이 이루어져 감상 시간에 따라 작품이 무한히 변화하는 콘셉트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할 때 이 회화 작품은 그림과 자연이 함께 시시각각 만들어 내는 창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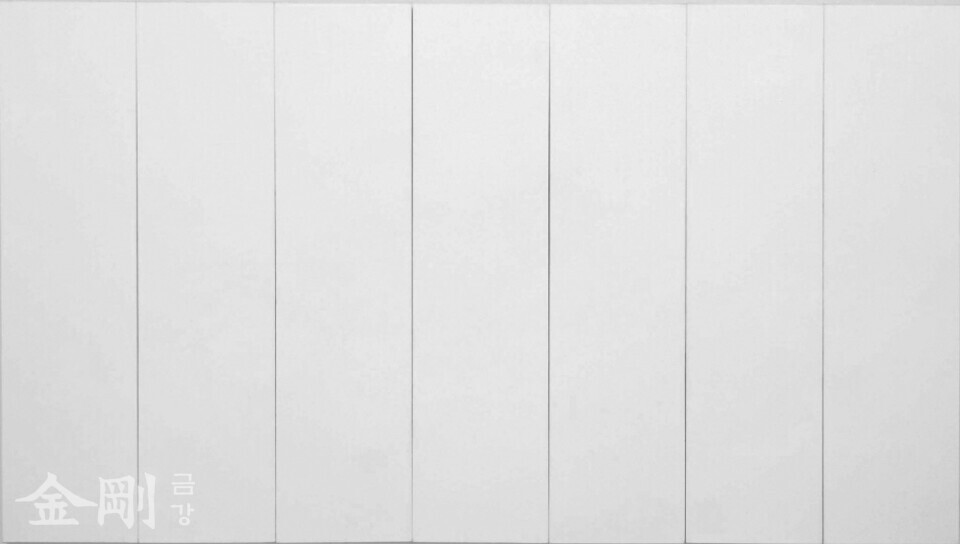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4분 33초’
작품의 연주 악기 역시 피아노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11월에는 (카라얀이 34년간 지휘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4분 33초’를 콘서트 엔딩곡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연주에 앞서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Kirill Petrenko)는 “독일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에 들어가서 베를린필도 2020년 11월 한 달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에서 관객 없이 진행된 이 연주에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만 존재한다. 12월 1일자 기사는 이 연주의 유튜브 동영상이 한 달 만에 5만 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1년 후 100만 뷰를 돌파하게 된다.
4분이 채 안 되는 이 연주를 보면, 1악장에서 페트렌코는 손을 아래로 내려 앞에 모았다가 1분여 시간 동안 천천히 옆으로 벌린다. 잠시 멈추었던 그는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마치 메시지를 전하듯 손바닥을 단원들 쪽으로 편 채 그들의 얼굴을 좌에서 우로 주욱 훑으며 2악장을 마무리한다. 3악장에서는 단원들을 향해 두 팔을 쭉 뻗고 비장한 표정으로 호소하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윽고 손을 툭 내리고 고개를 푹 떨구며 연주는 피날레를 맞이한다. 단원들은 그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소통을 하거나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겨 있었다. 피아노로 연주할 때는 연주자가 부동의 자세였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는 지휘자의 움직임이 있어 어느 정도는 ‘보는 음악’의 요소가 있다. 침묵이 유지되지만 지휘자의 표정과 몸의 언어로 곡의 분위기를 소통하는 변화가 흥미로웠고, 침묵에 이렇게 깊은 감정이 담길 수 있음을 전달하는 계기도 되었다.

우연성과 임의성의 음악 그리고 침묵
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작곡가가 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음을 선택하는 임의성과 우연성을 수용한 작품이 ‘4분 33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지의 음악이 ‘우연성 음악’ 혹은 ‘불확정성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케이지는 침묵을 통해 관중을 ‘일상의 삶이라는 음악’에 익숙해지도록 안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상은 연극무대이고 모든 인간은 배우다.’라고 했던 셰익스피어처럼 케이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소리가 다 음악’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작곡가가 장악할 수 없는 음악, 연주할 때마다 달라지는 음악을 만들어 주변 소리의 무한한 조합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도록 요구했다.
케이지의 스승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는 “에고(Ego)의 활동을 줄이고 나 외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선(禪)”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 온 음악에 선불교의 좌선 수행만큼이나 엄격한 기준을 접목하겠다고 결심한 케이지는 우연성의 음악을 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보다는 질문을 통해 곡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우연성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케이지는 〈주역(周易)〉을 사용했다. 그는 “주역은 ‘받아들임’을 가르쳐주며, 우연의 작업을 사용하려면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답을 얻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주역은 슬픈 운명을 약속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최소한 나를 변화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케이지는 말한다.
케이지는 이렇게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에게서도 발견했고,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소로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숲속으로 걸어갔다. 마치 지금 가는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든 마치 빈 잔에 물이 차오르듯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사람들이 대체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한 채 걷기 때문에 한참이나 지나야 숲속에 있는 것들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

소리 없는 소리 그리고 선불교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소리 없는 소리’가 연주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참으로 ‘선(禪)적’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1952년 당시 선은 아직 미국인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관중들은 경악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 케이지의 ‘4분 33초’는 당시까지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종교로 알려진 선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서구에 소개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기대하던 소리가 없고 침묵이 계속될 때 관중은 처음에 충격을 받고 당황한다. 마치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으로 가득한 화두를 받고 당황하는 선 수행자와 비슷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하지만 관중은 이윽고 호기심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은 화두를 천천히 참구하는 수행자와 유사한 입장이다.
케이지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대중이 접근 가능한 불교를 미국에 처음으로 전했다고 알려진 스즈키 다이세츠에게 불교를 배웠고, 이후 선불교적 원리를 자신의 전위예술에 접목했다.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교 원리를 탐구했고, 그런 탐구를 통해 미국의 음악 풍경을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자신의 선불교적 관점도 성숙시켰다. ‘4분 33초’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던 1962년 케이지는 존 레논의 아내인 요코 오노(小野洋子)와 함께 일본을 방문해 당시 92세가 된 스승 스즈키를 만났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침묵이 무엇인지 그 정수를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경배였다.

하버드대학 무향실 체험
‘침묵’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던 케이지는 1951년 하버드대학에 해군연구소가 설립했던 ‘무향실(無響室, Anechoic chamber)’을 찾는다. 외부 소음과 격리된 무향실은 소리나 전자기파의 반사를 막기 위해 흡음재로 만든 방으로, 미 대륙에서 가장 조용한 방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그 방 한가운데 선 케이지는 완전한 침묵을 경험하리라 기대했지만 높고 낮은 두 가지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후에 엔지니어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자 ‘높은 소리는 당신의 신경체계가 작동하는 소리고, 낮은 소리는 당신의 피가 순환하는 소리’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4분 33초’가 탄생했는데 초기 제목은 ‘침묵의 기도(Silent Prayer)’였다고 한다.
완전한 침묵(Silence)은 케이지의 기대처럼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을 경험한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생각과 감정들은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한다. 우리의 생명만이 생멸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찰나마다 생멸을 거듭한다. 생각은 뇌가 전하는 언어이고 감정은 우리 가슴이 전하는 언어다. 명상과 참선을 통해 언어가 끊어진 그곳, 생각과 감정이 끊어진 그곳에 도달할 때 진정한 적멸 또는 니르바나가 있으며, 바로 거기에 진정한 침묵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케이지의 저서 〈침묵(Silence)〉
1952년 8월의 연주 ‘4분 33초’는 케이지가 오래전부터 신앙처럼 간직했던 침묵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순간이었다. 케이지는 자신이 발견한 독창적인 ‘침묵의 언어’를 주제로 여러 곳에서 강연했고, 웨슬리안대학 출판부는 이를 모아 1961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침묵: 강의와 글 모음(Silence: Lectures and Writings)〉이었다.
“‘무(無, Nothing)’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유(有, Something)’를 탐구해야 한다. ‘유’는 땅이며 색이고, ‘무’는 하늘이며 공(空)이다.” 등 음악의 방법론인지 선(禪)의 방법론인지 모를 말을 담은 이 책에서 사고의 독창성을 발견하고 찬양한 작가가 있다. 〈뉴욕 3부작〉·〈빵굽는 타자기〉 등을 쓴 저명한 작가 폴 오스터(Paul Auster)는 소설 〈4321〉에서 주인공의 친구를 통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치, 〈침묵〉을 꼭 읽어야 해. 안 그러면 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 단지 다른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도록 원하는 것만 생각하게 될 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열린 예술축제 ‘플랫폼 서울 2008’에서 〈침묵〉의 한 문구를 전시 제목으로 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I have nothing to say and I am saying it).”

음악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
신실한 불자이며 미술비평가인 케이 라슨(Kay Larson)은 케이지의 삶과 음악에 대한 저서 〈심장이 뛰는 곳에(Where the Heart Beats)〉를 출간했다. ‘존 케이지, 선불교, 그리고 예술가의 내적인 삶’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2013년 출간되었다. 저서에서 라슨은 “선불교와의 만남으로 인해 케이지가 음악의 진정한 목적은 ‘불교 명상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금 이 순간의 빛나는 실재에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한다.
또 “‘좋은 음악은 좋은 삶으로 데려다주는 안내자여야 한다.’고 믿었던 케이지는 음악을 ‘목적 없는 유희’며 다만 ‘삶에 대한 긍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깨어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음악이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며, 피조물을 개선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했다.”고 전한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관조와 명상
케이지의 획기적인 작품 ‘4분 33초’는 관객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관객이 무언가를 스스로 얻게 한다. 이 작품과 함께하는 동안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예술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에 참여하여 작품을 창조하고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한다. 이제 예술은 소비재가 아니라 다차원적 경험의 일부가 된다. 아무리 좋은 CD나 MP3라도 이런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나의 음악회가 열리면 그 무대를 위해 평생을 매진해 온 음악가가 거기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연주회장에 입장해서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관객이 있다. 그렇게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내는 90분이라는 시간은 선객들이 선방에 모여 하나의 화두와 씨름하며 마음길을 찾아가는 순간처럼 고귀한 에너지로 충만하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의 장이 된다.
케이지는 관객을 침묵의 시간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움과 집중을 경험하게 했다. 관객은 이런 비움과 집중을 통해 관조와 명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일상의 소리는 음악이 되고, 삶의 우연성은 예술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