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剪定)과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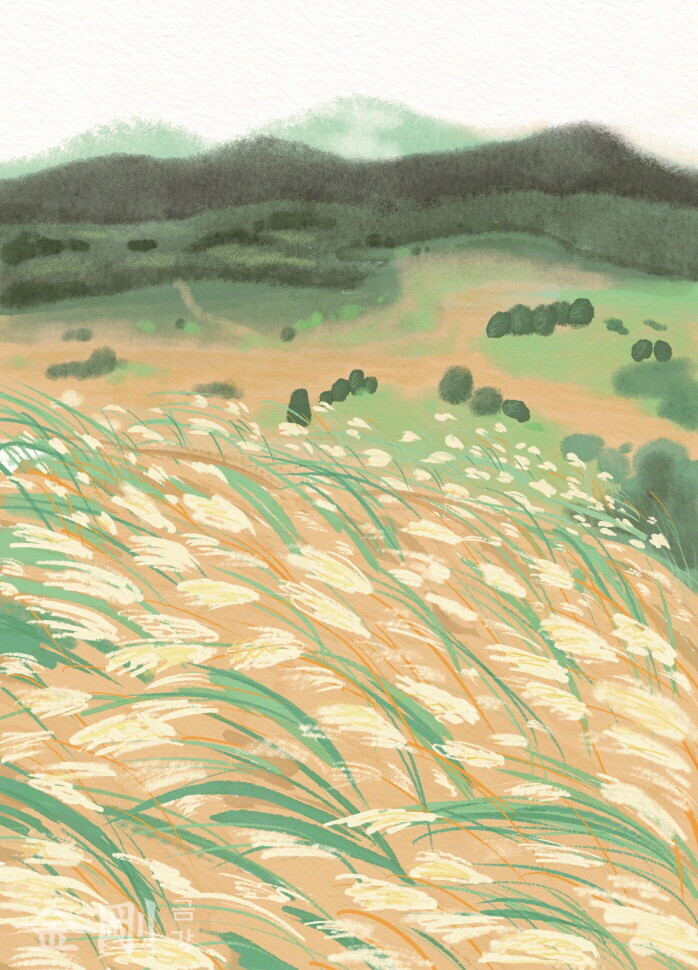
어쩔 수 없는 일
폭우와 폭설을 감당하는 일도 버겁지만 바람을 감당하는 일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얼마 전 또다시 실감했다. 쏟아져 내려오는 비는 물길을 돌릴 수 있고, 갑자기 내리는 많은 눈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노동과 땀으로 치울 수 있지만 바람이 야수처럼 불어오는 것은 막거나 대처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 그래서 물이나 눈보다 바람이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다. 저녁에 시작된 바람은 밤이 되자 점점 몰아쳤다. 전기가 들어왔다 나가기를 거듭했다. 집안의 전기를 최대한 껐다. 집은 바람 속에 섬처럼 있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집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했지만, 옆집과 돌담 뒤의 밭에서 이런 저런 것들이 날려 왔다. 유리 창문을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연신 바깥으로 나왔지만, 큰 쌀가마니 무게의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속수무책으로 불어 닥쳤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정도였다. 동네에서 기르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다급하고 요란하게 들려왔다. 고사목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바람 소리로 꽉 채워졌다. 바람은 거대한 물질 같았다. 하나의 콘크리트 벽 같았다. 완강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바람이 다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바람의 위세가 점차 약해졌다. 해가 뜬 후 보게 된 집 주변은 어지러운 덤불 같았다. 나는 덤불 속에서 사는 사람 같았다. 덤불을 걷어내는 일이 내가 할 당장의 일이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지지목
봄이 오고 날이 풀리면서 할 일이 많아졌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나무를 심는 일이다. 묘목을 길러서 파는 곳에 가서 몇 가지 수종을 샀다. 벚나무와 제주 백일홍과 하귤나무 등등이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니 봄에는 벚나무의 꽃핌을, 여름에는 제주 백일홍의 꽃핌을 보게 될 것이고, 늦가을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때에는 하귤나무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어린 묘목을 옮겨올 때에는 묘목의 뿌리와 흙을 잘 감싸서 갖고 와야 한다. 말하자면 뿌리와 뿌리가 내리고 있는 흙은 어린 묘목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사람의 마음에 늘 고향의 공간과 추억이 뿌리와 흙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나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나무가 살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물을 충분히 주는 것, 그리고 심은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묘목을 길러서 파는 나무 농장의 주인이 권장하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어린 묘목에 네 양동이의 물이 필요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은 매일 물을 주되 낮에 물을 주라고 알려주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지목을 꼭 세워줄 것도 당부했다. 제주는 특히 바람이 세고 잦아서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를 내리는 데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 살거나 새로운 날을 살 때에도 이 같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던 곳의 흙을 갖고 오고, 물을 대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목을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살게 될 때에는 주변의 배려와 사랑과 신뢰와 응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무와 사람의 살림이 다르지 않다.
새의 꽁지깃
한 지인을 만났더니 귤밭과 마당에 찾아오는 새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동백나무에 찾아오는 동박새와 귤밭에 찾아오는 직박구리 사진도 있었다. 동박새는 참새목에 속하는 새인데 몸집이 작고 위쪽의 깃털색이 황록색을 띠는데 그 우는 소리가 참 곱다고 했다. 동백꽃의 꿀을 좋아해 동백나무에 날아와 앉는다고 했다. 내가 동박새를 처음 본 곳은 아마도 고창 선운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선운사 대웅전 뒤편엔 아주 큰 동백나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동박새를 보았던 것 같다. 직박구리는 동박새보다 몸집이 좀 더 큰 편이다. 몸에 잿빛이 돈다.
지인이 찍은 새들의 사진을 보고선 나도 내 시골집 주변에 살고 있고, 찾아오는 새들을 찍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카메라를 갖고 새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생겼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움직여 새 가까이 갔다. 인기척에 놀라 날아가는 새들도 있었지만 몇 컷의 사진을 얻었다. 그런데 내가 새들에게서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엉뚱하게도 꽁지깃이었다. 어떻게 몸의 깃털색을 저렇게 타고 났을까 신기했고, 또 우는 소리가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맑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흥을 일으키는 것은 꽁지깃의 움직임이었다.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거나 그 끝에 앉거나 전깃줄에 내려앉았는데 수시로 이 꽁지깃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짐작을 했지만 아무튼 이 발랄하고 잰 움직임에는 분명 신나는 뭔가가 있는 듯이 느껴졌다. 게다가 해가 뜨는 아침에 새의 이 꽁지깃을 보고 있으면 오늘 내 하루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더 새날의 아침에는 이 일을 일과처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렴 어떤가. 생명의 움직임으로부터 활력과 기쁨과 흥미를 얻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내 일상의 아침도 마치 꽁지깃이 있는 듯 절로 춤추듯 움직이니 그것으로 충분한 일일 테다.
아무 문제없이 영원한
‘사바(娑婆)’라는 말이 있다. 괴로운 일이 많은 인간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은 참고 견딘다는 뜻도 있다. 참고 견뎌야 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이 곧 수행이기도 할 테다. 스님 한 분을 뵈었더니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우리 인생은 긴 꿈이지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실은 꿈 깨는 공부이에요. 아, 꿈이었네 하고 깨닫는 순간 다 해결이 돼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요. 우리 인생이 긴 꿈이니 죽는 것도 꿈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없이 영원한 ‘나’가 본래의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게 다 긴 꿈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다. 모두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꿈속에서 죽는 것이요, 아무 난처한 일 없이 영원히 사는 ‘나’의 본래면목을 평소에 잘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 인생이 꿈이라고 여긴다면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소유욕과 욕망도 허망한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스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전정(剪定)
봄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 농사일 가운데 하나는 과일나무의 가지를 잘라 주는 일이다. 대개는 수형(樹形)을 만들기 위함이지만 나무 내부의 속가지를 솎아내는 일을 함께 하게 된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자두나무와 포도나무를 전정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지만 내가 직접 전정을 하게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과일나무의 전정에 대해 알아보니 전정은 열매가 달릴 가지의 수를 염두에 두어서 열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요,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매달리는 위치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무의 수령이 많아질수록 전정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노목이 될수록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잘한 전정은 나무의 내부 사방으로 햇빛이 잘 들게 하는 것임을 이웃집 사람이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나무의 내부에 양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무에 적용하는 전정의 방법은 나무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테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도 맞추어 쓸 만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알맞게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라는 나무도 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간격
간격을 요량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최근에 깨달았다. 해바라기 씨앗을 얻어 와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심었는데 씨앗으로부터 싹이 일제히 올라왔다. 그런데 싹들을 보는 사람마다 무슨 씨앗을 이렇게 바투 심었느냐고 한마디씩 건넸다. 이렇게 해서는 해바라기가 자랄 수 없으니 비가 오는 날을 잡아서 옮겨 심어야 한다고도 했다.
내가 보아도 너무 빼곡하게 씨앗을 뿌려놓아서 이대로는 도저히 될 성 싶지 않았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서 틈나는 대로 올라온 싹들을 보며 뼘을 재며 궁리를 하지만 알 도리가 없다. 빈틈없이 꽉 찬 상태도 문제지만 빈틈이 너무 큰 것도 문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농사의 일이나 조경의 사업이 영 엉터리라는 점이다.
가벼운 농담
가벼운 농담을 잘 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내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는 가볍고 유쾌한 농담을 잘 던지는 사람이 드물다. 너무 진지한 편이다. 나도 그런 축에 속한다. 말에 재미가 없다. 농담은 외우듯이 공부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싱싱하고 상쾌한 웃음이 가슴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다. 대체로는 느긋하고 딴청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가벼운 농담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대개 우리들의 대화는 자상하지 않고, 짧고, 밋밋한 경우가 많다. 지난주에 나는 농담을 꽤 고상하게 하는 분을 우연히 만났다. 동문시장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 명의 일행이 내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억센 사투리를 쓰는 여행객들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는데 식사 값이 81,000원이 나왔다고 주인은 일행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일행 가운데 한 분이 주인에게 말했다. “8만원만 깎아주세요.” 농담에 주인도 다른 손님들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문태준
시인.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맨발〉·〈가재미〉·〈그늘의 발달〉·〈먼 곳〉·〈우리들의 마지막 얼굴〉·〈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소월시문학상·노작문학상·애지문학상·서정시학작품상·목월문학상·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BBS 제주불교방송 총괄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