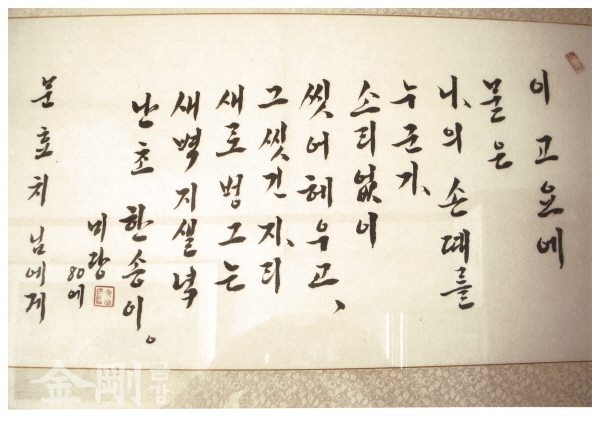"시인은 내가 아니라 내 마누라일세"

1965년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쯤으로 기억된다. 빈 강의실에서 동국대학교 문학동아리 합평회를 마치고 모두들 함께 나오는 길이었다.
“자네 우리 집에 한 번 놀러오게.”
지도교수로 모셨던 서정주(1915~2000) 선생님께서 나에게 건넨 말이다. 나는 순간 가슴이 뛰고 아찔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합평회에 내놓은 회원들의 작품 중에서 선생님이 호평을 해주신 뒤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분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습작품을 들고 선생님 댁을 드나들게 되었다.
집으로의 초대와 술대접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그보다 3년 전인 대학 국문과에 입학한 직후였다. 누가 교수인지도 모르고 입학했는데, 양주동·서정주·조연현 등 당대 최고 문인들이 교수로 계셨다. 나는 그분들의 제자가 된 것을 매우 큰 긍지로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교수들 중에서 특히 서정주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건 무한한 행복이었다. 고교시절 책에서 그분의 글을 읽고 흠모해오던 나로서는 그분이 계시는 이 학교가 좋았고, 덩달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인 강희근·박제천·홍신선·조정래·김초혜·홍기삼·정희홍·홍희표 등도 마냥 좋았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주옥같은 강의를 들으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학생활은 정말 꿈결 같은 황홀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늘 아쉬운 것은 서정주 선생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선생님 댁을 찾아다니며 작품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을 독대하여 뵙는 일이 너무 두렵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 용기를 내지 못했다. 속으로만 좋아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 나는 끝내 선생님 댁을 가보지 못하고 이대로 졸업하고 마는가 보다.’
나는 습작도 열심히 하며 등단의 꿈도 키워왔지만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그날의 합평회는 내게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찾아가면 으레 술대접을 해주셨다. “순덕아!” 하고 부르시면 술상이 스르르 나오곤 했다.선생님은 강의, 강연, 행사참여 그리고 원고 쓰는 일로 늘 바쁘셨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한가한 듯 여유가 있었다. 한 잔 하시면서 한 말씀이,
“난 말이야, 대통령은 바빠서 못하겠고 한가한 부통령이나 하라면 하겠네. 하하하 …….”
선생님은 다소 장난기도 있는, 소년같이 순수한 분이셨다. 특히 그 웃는 모습은 천진난만하기까지 했다. 한 번은 문우들과 함께 댁을 방문했을 때 목탁을 ‘탁탁탁’ 세 번 두드리셨는데 술상이 스르르 나오는 것이었다. ‘순덕아’하고 부르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신호였다. ‘순덕아’ 단 세 음절, 말로하면 될 것을 이런 신호를 정한다는 건 무척 재미있는 발상이었다. 또 얼마를 지나 방문했을 때는 큰 소라나팔이 목탁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무개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사다 준 걸세. 뿌~~~”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온 집안에 퍼졌다. 이어서 술상이 또 스르르 나오는 것이었다.
“어떤가. 재밌지? 참 재밌네. 자네도 집에 가서 해보게, 참 재밌어. 하하하 …….”
얼굴 만면에 주름을 잡으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순박한 소년과 같았다. 학생 제자에게 일일이 술대접을 하시는 그 후한 성품, 참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그분을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었다. 그 집 분위기에서 풍겨 나오는 시적 정취, 그분의 모습과 음성에서 번져나는 인간미에 감동하면서 당신의 시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따라가며 습작도 했다. 앞에 내놓은 습작품을 보시며 “다른 것 없나?” 하시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주워들고 집에 와서 낑낑대며 고쳐 쓰기를 반복했다.
세배객과 가족사랑
공덕동 선생님 댁은 대문 옆에 작은 쪽문이 나 있었다. 평상시에는 이 쪽문만을 사용했다. 훈련을 시키고 공부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성장해 가는 걸 무척 대견해 하셨다. 좋은 작품을 쓰게 되고 당신이 어느 정도 흡족해 하실 때쯤이면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오면서 배웅해 주기도 했다. 이럴 때에는 쪽문이 아닌 큰문을 열고 “시인 나가신다.” 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곧이어 문예지에 추천되거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면 선생님 댁은 세배객들로 매우 붐볐다. 문단의 가장 큰 어른께 문인이나 문학 지망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선생님의 사랑방은 이런 때 신년인사를 올리는 장소만은 아니었다. 평상시 작품이나 이름만 알고 지내던 문인들을 만나 서로 인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어느 해던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새해를 맞아 홍신선·정의홍 등과 세배를 드리러 갔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객들이 가득 앉아 술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침부터 몰려온 문사들과 새해 축하주를 마시다보니 선생님은 취해 잠들어 버리고, 이어서 밀려드는 객들은 주무시는 선생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회포를 풀며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왁자한 사랑방에서 한가하게 주무시는 선생님의 얼굴 표정에는 평화가 가득 서려 있었는데, 주인은 재워놓고 객들끼리 수인사하며 유쾌하게 떠들어대는 풍경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풍경이 아닐까 싶다. 정초가 되면 해마다 이런 날이 한 주 정도는 이어지곤 했는데 선생님은 즐거우실지 모르지만 사모님은 모진 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사람의 경계를 걷어버리고 완전하게 개방된 ‘서정주의 방’은 시인들의 천국이었다. 물론 평상시에도 이 사랑방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을 뵙고자하는 국내·외 많은 문인, 학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 방에서 문학을 논하고 시를 말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때로는 대학원생들의 교실이 되기도 했고, 혹은 문학단체 관계자들의 회의장소이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학인들의 논쟁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정주 시’의 집필실로서 우리 현대시의 위대한 산실이라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선생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무척 큰 분이셨다.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두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다.
“우리 애들이 효잘세.”
내가 문학청년 신분으로 선생님 댁을 드나들 때 막내아들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었다.
“윤이가 말이야, 국제학교에 다니는데 미국의 장군아들도 있고, 서양 어느 나라 대사의 아들도 있고 하는데 한국 시인의 아들이 1등을 했다네.”
하시며 매우 흡족해 하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모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자별(自別)하셨다. 내가 사모님을 처음 뵌 건 대학 때였다. 선생님 댁을 어렵게 처음 방문하고 한 서너 번째 방문한 때였을 것이다.
“여보 이리 좀 와 봐요.”
사모님을 부르시더니
“인사하게 내 마누랄세.”
나는 얼떨결에 사모님을 뵙고 절을 올렸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며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세상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의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시인의 부인은 대단한 미인으로, 세련된 현대여성일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사모님을 뵙는 순간 나는 무엄하게도 실망을 금치 못했다. 너무나 소박하고 수수한 촌부(村婦)의 모습이었다. 인사를 올리고 무언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사모님, 젊으셨을 때는 미인이셨겠어요.”
하고 말해버렸다. 이것은 내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건 자네가 나를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일세.”
선생님의 이 말씀에 나는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듯 멍했다. 아차, 싶었지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선생님을 찾아 뵐 때마다 나는 사모님이 챙겨서 들여보내는 술상을 많이도 받아먹었다. 정초에는 따뜻한 떡국을 내놓으셨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인은 내가 아니라 내 마누라일세.”
“네?”
“우리 마누라가 하루는 ‘여보 관악산이 우리 마루로 걸어 들어와요.’ 이러지 않겠나.”
사모님은 시인을 모시고 살다가 시인이 되신 것이다. 어쩌면 사모님이 이 나라 대시인을 모시고 섬기며 사신 공로도 엄청 크리라 생각한다. ‘팔할이 바람’인 선생님의 부인 노릇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간다.
공덕동 마포경찰서 뒷골목을 통과하여 선생님을 뵈러 찾아가던 길이 그립기 그지없다. 마당이 넓지는 않았지만 가운데에 모란이 오복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초여름 어느 날 하얀 옷을 입으시고 빨간 모란꽃 앞에 앉아 모란의 웃음소리를 감상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언젠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란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어땠냐 하면 ‘ㅎ음’이었어. 흠흠흠 이렇게 웃지 않았겠나?”
우리는 시인의 귀가 참으로 밝다는 생각을 했다. 색깔을 소리로 바꾸어 듣는 청력은 놀라웠다.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리고 빌딩이 들어섰을까? 아니면 지금도 남아있어 그 누가 살고 있을까?
“내 제자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두려웠다. 너도 내 제자니까 쭉정이가 아니라는 격려의 말씀인지, 아니면 너도 내 제자라면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훈계의 말씀인지.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아 무섭다.
“시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 자만하지 말고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정진하라는 말씀인 듯하다.
나는 지금도 가끔 내 문학 후배들과 선생님의 나라, 고창의 여기저기 줄포의 여기저기를 찾아가곤 한다. 그들에게 선생님의 시의 기운을 받게 하고 싶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