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교리의 핵심만을 골라 쓴 경전이라는 뜻에서 ‘심경(心境, Heart Sutra)’이라고 부르는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空, Śūnyatā)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과 재액에서 벗어났느니라[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 반야심경의 첫머리
‘공’은 미묘한 뜻을 갖고 있으나, 일차적인 뜻은 ‘없음’이다. ‘없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체 사물에 실체(實體)가 없다.’는 뜻이다. ‘실체’란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진 독립된 개체’라는 뜻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自性)과 그 뜻이 비슷하다. 그리고 오온은 일체 사물의 구성요소로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가리키지만, 줄여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해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가진다. 하나는 ‘일체 사물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체 사물에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돌멩이나 깡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존재들은 무엇이고, 하늘의 별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자로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양자 중력이론의 연구로 이름이 있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 1956~)는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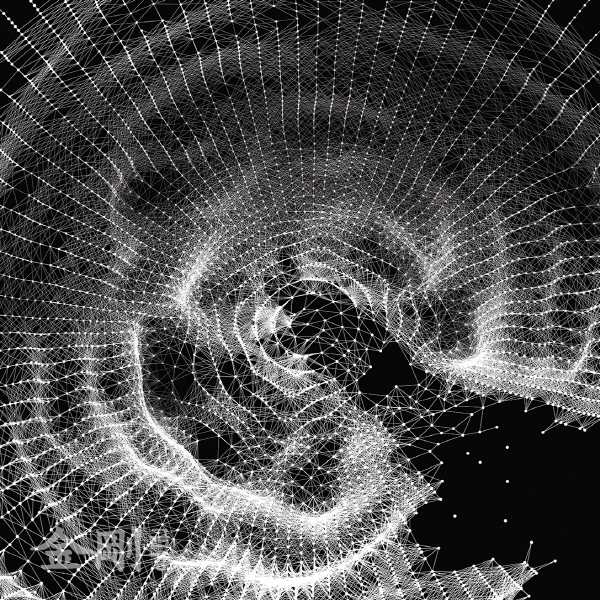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세계에서는 물리계들 사이의 관계(relations between physical systems) 속에서가 아니고는 그 어떤 실재(reality)도 없다. 사물(things)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물의 개념을 낳는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대상(물건, objects)의 세계가 아니라 사건(events)의 세계이다. …… 양자역학은 세계를 이런저런 상태를 가지는 사물로 생각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 그리고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로벨리는 연기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 내용은 사실 연기법을 설명한 것이다. 로벨리의 말대로 이 세상은 어떤 대상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졌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진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난 사건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일어난 사건은 바로 사라지지만 그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새로운 사건을 생겨나게 한다. 사라진 사건 역시도 앞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얽혀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인과적으로 얽힌 ‘사건의 흐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다. 인과적으로 얽힌 사건의 흐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하면 사람들은 ‘이 사건의 흐름’을 보고,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곡해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는 것도 인과적으로 얽힌 하나의 사건의 흐름이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동일성(同一性)을 말해주는 아무런 요소도 없다. 몸을 이루는 물질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느낌이나 생각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인과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10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런 점은 다른 사물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라는 것에도, 주변에서 보는 물체에도 불변의 실체는 없다. 이것이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이치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건과 그 흐름으로 이루어져서 실체가 없다.’는 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일까? ‘도일체고액’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실체론과 이분법적 사고
그리스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리스의 학문은 4세기말까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학문의 중심은 도서관이자 종합교육기관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Mouseion)이었고, 무세이온의 학문을 이끈 사람은 히파티아(Hypatia, 370?~415)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히파티아는 수학과 철학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날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성과 인품을 존경하고 있었다. 히파티아를 향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답고, 지성은 철학자 플라톤의 화신’이라고 묘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히파티아는 그녀를 마녀로 생각한 군중들로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한다. 일설에 의하면 군중들은 사금파리로 히파티아의 시체에서 살과 뼈를 발라냈다고 한다.
히파티아를 마녀로 지목하고 군중들로 하여금 그녀를 살해케 한 사람은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던 성 키릴로스(Saint Cyrillus of Alexandria, 375?~444)였다. 키릴로스는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양쪽으로부터 성인(聖人, saint)으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당시 이단을 가리는 심판관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예수는 사랑을 가르치고,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또 사람의 잘못을 일곱 번씩 일흔 차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교가, 그것도 훗날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왜 히파티아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하도록 군중을 부추겼을까? 그것은 키릴로스가 예수의 가르침과 성서를 실체론(實體論)적으로 해석하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았기 때문이다.
‘실체’란 다른 것과 구분되는 독립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사고(思考)하게 된다. ‘나 자신’이 옳고 ‘선(善)’이라면 ‘나’와 다른 상대방은 그르고 ‘악(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의 실체는 악마일 것이기 때문에 악을 멸하는 것이 곧 정의가 된다. 키릴로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저지른 행위는 정의를 실현한 일이었고, 세상을 정화시킨 일이었다.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범죄들은 종교 또는 그와 비슷한 성스러운 동기란 미명아래 행해졌다. 바로 종교전쟁과 마녀사냥이 그것이다. 오죽하면 아일랜드의 극작가 숀 오케이시(Sean O’Casey, 1880~1964)가 “정치는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지만 종교는 그보다 열배는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했을까.
사물에 실체가 있다면 선과 악의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쪽이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에 평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복도 없을 것이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악’이라는 실체가 없어질 리 없고, 악했던 마음이 선해질 리 없다. 따라서 악으로 인한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에 실체가 없다면 악은 무지(無知)가 원인이므로 수행을 통해 그 잘못을 참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첫머리에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이라고 설한 것이다.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 1946년생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소립자 물리학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퇴직 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 학 · 석사학위를 취득 후 경상남도 함양에 약천사를 창건했다. 이곳에 불교과학아카데미를 개설, 2014부터 매월 불교와 현대물리학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천태사상으로 풀이한 현대과학>,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