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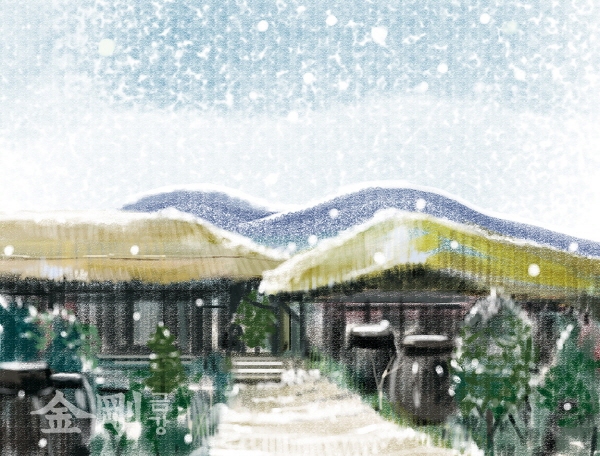
그 해 늦은 봄날 양지바른 집 모퉁이에서 일곱 살인 나는 누님에게 등짝을 두 차례나 모질게 얻어맞은 기억이 난다.
나보다 여섯 살이 위인 누님은 무슨 심부름인가를 보내려고 나를 불렀던 것이고, 대답이 없자 이 방 저 방을 다 뒤지며 찾아다녔던 것이다. 혹시 측간이나 우물에 빠져 죽지 않았는지 불길한 생각을 하며 집안을 발칵 뒤집으며 찾았다.(이것은 철이 든 다음 누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한 추체험이다.)
누님이 나를 찾았을 때, 나는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느긋하게 몽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푸른 하늘 위를 지나가는 흰 구름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있었는지, 거슴츠레하게 뜬 눈의 속눈썹 사이로 날아드는 무지갯살 어린 햇살을 즐기고 있었는지, 좌우간 나는 양지바른 오목한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나를 찾은 순간 누님은 아무 탈이 없는, 사랑하는 동생으로 인한 반가움과 능청스럽고 태연스럽게 앉아 있는 나의 태도에 노여움이 교차하여 나의 등짝을 두 차례나 때린 것이었다.
이후 나는 집안에서 아주 의뭉스러운 아이, 알 수 없는 엉뚱한 아이가 되었다. 누님은 손 맞잡이인 세 살 터울의 남동생보다 여섯 살 아래인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다. 맛난 음식이 있으면 감추어 두었다가 형에게는 주지 않고 나에게만 몰래 주곤 했다.

내가 일곱 살 때(1945년), 그것은 지금부터 73년 전의 이야기이다.
홀아비인 할아버지가 59세, 아버지가 40세, 어머니가 31세, 누님이 13세, 형이 10세, 동생이 4세, 그 아래 동생은 1살 해방둥이로 엄마의 젖을 먹고 있었다. 그 시기는 나의 동화기(童話期)였다. 동화기란 현실적인 일과 상상의 세계가 혼동되는 시기를 말한다.
사랑방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문훈장을 하시던 할아버지의 방에서 형과 나는 한문을 배우고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와 방귀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런 7살 때 집 모퉁이의 양지 바른 곳에 혼자 앉아 넋을 빼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나를 취해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를 문득 생각하곤 한다. 그것은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을 때 날아오는 보리까라기 같은 광망(光芒),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무지개빛살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신비한 어떤 세계를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7살 전후로 내 머리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색깔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속눈썹들 사이로 스며들어온 신비한 무지갯빛 광망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의 푸른 어둠이었다.
공포의 푸른 어둠, 그것은 다섯 살 때의 기억인데 평생 동안 내게 물에 대한 공포증(물 무섬증)으로 작용했다.
마당 가장자리에 자그마한 방죽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그것은 뒤란(뒤뜰) 언덕에서 댓잎을 따다가 만든 작은 놀이 배였다. 방죽 가장자리로 멀어져간 배를 끌어당기려고 한 손을 뻗쳤다가 나는 물로 넘어졌고 머리를 처박았던 것이다. 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한동안 허우적거리다가 어렵사리 간신히 물 밖의 밝은 세상으로 기어 나왔다. 그때 방죽의 물속에서 본 어둠이 검푸른 색이었다. 거기서 기어 나오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
이후 나는 세상의 모든 물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 어른이 된 다음 나는 바다의 부두 끝에서 수런거리며 출렁대는 물과 강물과 호수를 무서워했고, 여자도 물로 인식되어 어지럽고 무서웠고, 빠져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지곤 했다.
또 하나, 생생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해방년 9월, 징용에 갔던 삼촌이 돌아온 것이었다. 삼촌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비탈진 골목길을 달려갔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제비라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두 팔을 십자로 벌리고 발을 최대한으로 빨리 움직였다. 나는 제비처럼 날아서 골목길을 날아갔다. 나를 환희에 잠기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기막힌 달리기를 즐기곤 했다.
삼촌과 나의 만남은 시장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작달막한 삼촌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렸다. 말없이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삼촌의 머리 위에서 나는 세상이 어지럽게 기우뚱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해 봄과 여름은 일제식민통치가 엄혹하던 때였고, 한창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일제는 그것을 ‘대동아전쟁’이라 불렀고, 식민지인 한반도에서 총동원령을 내렸다. 먼저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자들을 동원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갔다. 일본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설득했다는 것이었다.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다. 마을에는 과년한 처녀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른들은 딸을 정신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열다섯 살이 지나면 서둘러 시집을 보냈다.
아버지는 열아홉 살인 막내 여동생(고모)과 열여덟 살인 큰 딸을 서둘러 시집보냈다. 두 차례나 거듭 서둘러 시집보내려 하다 보니 아버지는 매제감과 사위감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 몸 건강하고, 계집 하나 굶겨죽이지만 않을 듯 싶으면 매제 삼고 사위를 삼았던 것이다.
대덕 연평으로 시집보낸 막내 여동생(고모)의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 눈이 애꾸라는 사실을 살피지 못한 것이었다.(그때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의 눈에 명씨, 즉 목화씨가 박혔다고 수군거렸다.) 막내 고모는 첫날밤에서야 남편의 눈이 애꾸임을 알았던 것이다. 며칠 뒤 친가에 온 막내고모는 울고불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아버지는 “어찌 하랴, 어찌하랴, 그냥 살아라. 눈이 그래서 그렇지 남자는 똑똑하단다.”하고 달래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하시기만 하면 당신의 큰 아들(아버지)에게 “니 딸 같았으면 한쪽 눈 없는 놈한테 주었겄냐?”하고 타박을 하곤 했다.
삼촌이 징용에 간 것을 두고도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두고두고 원망과 지청구를 들었다.
“마을 유지네 어쩌네 하고, 어협조합장도 하고, 면소에 출입도 하고 어쩌고 똑똑하다고 소문은 났는데 징용 가는 동생도 하나 못 빼낸 나쁜 놈!”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하시기만 하면 담배대통으로 놋쇠화로를 두들기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곤 했다.

무더운 어느 날, 동네의 한 청년이 머리에 빨간 일본 국기를 그린 머리띠(히노마루 하지마께)를 하고 가슴에는 ‘武運長久(무운장구)’라는 한자 표어를 쓴 흰 천을 가새질러 차고 병대(兵隊)를 갔다. 동네 사람들은 일본국기를 손에 들고 병대에 가는 그 청년을 환송했다. 회진으로 건너가는 나루터까지 따라가서 환송을 했다. 그 청년을 앞장서 가는 것은 일본도를 허리에 찬 검정 제복의 순사였다. 순사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사 둘이 사립으로 들어섰다. 뒤에는 이장과 마을 머슴이 따랐다. 마을 머슴은 동각에서 살면서 회의 소집을 할 때, ‘다 들어 보시오, 오늘 저녁 잡수시고 한 집에 한 사람씩 동각으로 나와 주시오.’하고 욈소리(외워서 읊는 소리)를 하는 남자였다. 울력을 나오라고 독촉할 때나 공출을 독려할 때도 그는 욈소리를 했다.
이날 순사는 아버지에게 창고 문을 열라고 했다. 아버지는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나락을 저장하는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이미 공출을 할 만큼 하고 남은 것은 찧어서 많은 식구들이 밥을 지어먹은 것이었다.
순사의 콧수염이 예리한 눈빛과 함께 움직거렸다. 무언가를 예감한 그는 아버지를 앞장서서 뒤란으로 돌아갔다. 뒤란에는 언덕이 있었고 언덕 위에는 대나무가 촘촘 자라 있었다. 순사는 언덕 밑을 살폈다. 아버지는 순사에게 굴을 파서 숨기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밭 속으로 들어갔다. 댓잎들이 수북한 곳을 발로 쿵쿵 디디어보곤 했다. 끝내 굴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대밭에서 나온 순사는 사랑방 앞 툇마루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놋쇠화로를 손가락질했다. 마을 머슴은 서슴없이 그것을 들어다 마당가에 재를 비워버리고 들고 온 가마니 속에 넣었다. 그 속에는 마을에서 거둔 놋쇠그릇들이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누님은 그 이전의 수많은 밤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밭 저쪽에서 은밀하게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속삭였고, 절대로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밭이 끝나는 밭 가장자리에 굴 하나를 팠고, 거기에 나락 가마니를 숨겼던 것이다. 그 낌새를 안 누군가 발고를 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발각되지를 않은 것이었다.
훗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우리들은 꽁보리밥을 먹어도 되지만 느그 할아버지는 입이 짧아서 반드시 쌀을 얹어 드려야 하니께…….”
한승원

193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목선〉이 당선되며 활동을 시작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소설 원효〉, 〈초의〉, 〈다산〉 등 다수의 소설을 쓴 이 시대의 대표 소설가다. 고향 율산마을에서 바다를 시원(始原)으로 한 작품을 써오고 있다. 현대문학상 · 한국문학작가상 · 이상문학상 · 대한민국문학상 · 한국소설문학상 · 한국해양문학상 · 한국불교문학상, 미국 기리야마 환태평양 도서상 ·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