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원의 토굴살이 (265호)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내 증조모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다. 증조모가 천관사에서 백일기도를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의 할아버지이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몸이 아주 쇠약했다. 증조모는 쇠약한 아들을 위해 부처님께 시주를 하고 또 했다. 증조모의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과 문밖에 온 거지들이었다.
증조모는 거지 대접용의 개다리소반과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들을 따로 마련해놓고 손자며느리에게 사용하게 했다. 돌아가실 때 당신의 손자며느리에게 “나 죽으면 울지 마라, 나는 벌써 극락 세상에 가 있을 것인께. 울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송하기만 해라.”하고 당부하셨다. 아마 그 증조모의 원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전부터 석가모니 사상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홀연히 들려오는 목탁소리로 인해 잠을 깼다. 심장 모양의 황갈색 목탁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 속의 어둠을 울려 나오는 그윽한 소리.
찌는 듯 무더운 여름 한낮, 논에 멸구를 잡고 들어온 나는 큰방 툇마루에서 동생과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와 함께 일을 한 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자고, 아버지는 사랑방에 누워 잤다. 스물한 살 때였다.
스님은 예쁜 처녀의 목소리가 연상될 만큼 가느다라면서 청아하고 향 맑은 목청으로 염불을 하고 있었다.
고음으로 연주하는 클라리넷 소리 같은 염불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염불하는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밀짚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훌쭉한 회색 바랑을 등에 짊어진 앳된 유백색 얼굴의 스님은,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면서 목탁을 두들기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응시하는 허공을 나도 바라보았다. 파란 허공이 목탁 소리 같은 울림이 되어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해 늦은 가을 어느 날, 관산읍까지 30리 길을 걸어간 나는 용소동 뒷산 기슭의 꾸불텅꾸불텅 굽이도는 가파른 자드락길을 올라갔다. 천관사로 가는 길이었다.
지난 여름에 내 집을 찾아와, 청아하고 향 맑은 염불소리를 들려준 그 앳된 스님이 천관사에 뿌리를 두고 있을 듯싶었다. 자드락길 가장자리에는 마른 회백색의 억새풀숲이 무성했다. 겨우 내내 하얗게 바래진 억새꽃송이들이 한 많은 혼령처럼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달려온 북서풍 한 자락씩을 움켜쥐고 춤을 추면서 ‘후리휘히 후리휘히…’하고 소리쳐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감성적인 허무의 노래로 내게 다가왔다. 내 가슴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담기고 있었다.
천관사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다. 자그마한 전각 하나가 허허 벌판 동북쪽에서 서남쪽을 향해 주저앉아 있었다. 그 앞으로는 까만 구들장과 타다가 만 기둥들이 자빠져 있었다. 육이오 전쟁 때에 불탄 것을 치우지 않고 있었다.
전각 문지방 위에 걸려 있는 ‘대웅전’이란 현판이, 고양이 머리에 씌워 놓은 탕건 같았다. 찬바람이 매섭게 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쪽에 체구 자그마한 금빛 불상이 눈을 반쯤 감고 앉아 있었다. 불상 주위에 음음한 보랏빛이 번지고 있었다. 억새들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전각 안을 맴돌았다. 불상이 왜소하고, 쓸쓸해보였다.
그 전각 맞은편에 회갈색의 요사채가 있었다. 동남쪽 갓방의 댓돌 위에는 허름한 흰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는데, 그 옆방의 댓돌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내가 말했을 때, 모퉁이 방에서 잿빛의 솜두루마기와 통바지를 입은 머리칼 반백의 늙수그레한 여자가 나왔다. 스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나의 위아래를 살피면서, 스님이 출타 했노라고 말했다.
지난여름의 앳된 스님을 머리에 그리며, 스님 나이가 몇 살쯤 되느냐고 내가 묻자, 그녀는 내 검정 핫바지 차림새와 덥수룩하게 긴 머리를 다시 뜯어보고 나서 말했다.
“세속 나이로 환갑이 지나셨어요.”
나는 다시 제쳐 물었다. “혹시 여기에, 스무 살 쯤 된 스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댓돌에 신이 놓여 있지 않은 서북쪽 갓방에다 희망을 걸고, “방 한 칸을 얻어 공부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하고 말했다. 만일 방 한 칸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봇짐 싸 짊어지고 와서 묵으며 부지런히 책을 읽고 시와 소설을 쓰고 싶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이 방은 스님이 쓰시고, 저 방은 고시공부하는 학생이 쓰는데……그 학생은 시방 고향집에 다니러 갔어요.”
나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불에 탄 흔적들을 다시 둘러보았다.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는 한동안 대웅전을 등진 채 쓰러진 기둥과 바람벽들 앞에 서 있다가 몸을 돌렸다. 자드락길로 나서려 하는 내 발길 앞에서 마른 낙엽들이 들쥐들처럼 달려갔다. 비탈진 길을 내려오는 내 가슴은 서북풍에 춤추는 억새들의 혼령 같은 흰 꽃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앳된 스님은 어느 절에 있을까. 그 스님은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 스님의 혼령이 억새꽃으로 변하여 지금 나에게 서걱서걱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듯싶었다.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점을 쳐다보면서 그 말을 해독했다.
‘너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라.’
두 해 뒤에, 서울 미아리에 있는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는데, 거기 나보다 한 살 위인 스님이 있었다. 법명이 도안이었다. 자취를 하던 나는 쌀이 떨어지면 돈암동 적조암의 도안 스님에게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 스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경전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작가가 된 다음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 〈원효〉, 〈초의〉를 썼다. 소설의 주제는 모두 천관사에서 만난 억새밭의 바람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그 도안 스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관음사’를 열고 중생을 제도하시다가 얼마 전에 열반하셨고, 나는 늙바탕의 어느 해 문득 낙향하여 해산토굴에 몸을 담았다.
지난 이른 봄에 장흥 천관사 주지 지행 스님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 토굴에서 봄을 잡수시지 않으시렵니까?”하고 선문답 같은 말을 던졌다. 경관이 수려하고 장엄한 천관산 천왕봉을 배경으로, 많은 불사를 했다면서, 봄의 산나물 밥상을 전문으로 차리는 보살이 점심 준비를 할 거라고. 그리하여 천관사에 가서 봄을 먹고, 시 한 편을 썼다.
천관사에 가서 봄을 먹었다
보랏빛 오랑캐 꽃을 먹고
분홍빛 꽃잔디 꽃을 먹고
황금색 배추꽃을 먹었다.
질경이도 두릅도 먹고 칡 순도 먹었다.
꾀꼬리 울음소리 휘파람새의 울음소리
비둘기 소리 장끼 소리도 먹었다.
삼층 석탑도 먹고, 범종도 먹고, 대웅전 안의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먹었다.
나는 거대한 한 송이 꽃이 되어 가슴 두근거리며
해우소에 가서 가랑이를 벌리고
봄의 교향시를 휘갈겼다.
- ‘봄을 먹었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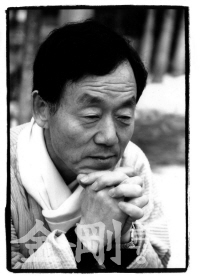
한승원
소설가. 193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목선’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소설 원효〉, 〈초의〉, 〈다산〉 등 다수의 소설을 쓴 이 시대의 대표 소설가다. 고향 율산마을에서 바다를 시원(始原)으로 한 작품을 꾸준히 써오고 있는 작가는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미국 기리야마 환태평양 도서상,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